0. 목차
-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 컨스털레이션 계획
- 오바마 정부가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취소시켰다.
1.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 체제(cold war)'가 계속되었다. '냉전 체제(Cold War)'란 양극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잠재적인 권력투쟁를 말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나라는 세계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 우주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1-1. 인공위성 경쟁에서 소련이 앞섰다.
먼저 그 막을 연 것은,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Sputnik 1)'였다. 스푸트니크는 지름이 겨우 58cm에 불과했지만,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은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소련은 '스푸트니크 2호(sputnik 2)'의 발사에도 성공하였다.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러시아어: Кудрявка)'라는 강아지가 타고 있었다. 1호의 무게는 약 83kg이었고, 2호의 무게는 약 508kg이었다.
한편 미국은 이듬해인 1958년 1월 31일, 육군의 개량형 미사일 '주피터 C(Jupiter-3)'에 의해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Explorer-1)'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 1호의 무게는 겨우 8.3kg이었고, 이는 시기와 질 측면에서 모두 소련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미국은 1958년 10월 1일에 NASA를 발족시켜 반격을 시작하였다.
1-2. 유인 우주 비행 경쟁에서도 소련이 앞섰다.
인공위성의 다음 목표는 유인 우주 비행이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Yurii Gagarin, 1934~1968)'은 '보스토크 1호(Vostok 1)'를 타고,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NASA는 캡슐형 유인 우주선을 로켓으로 발사하여, 우주에 도달하고자 하는 '머큐리 계획(Project Mercury: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계획)'을 추진했다. 침팬지를 태운 테스트 비행에 이어, 1961년에는 '앨런 셰퍼드(Alan Shepard, 1923~1998)' 우주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프리덤 7호(Freedom 7)'가 유인 우주 비행을 수행했다. 이때 소련의 유인 우주 비행은 108분, 미국은 15분 28초였다. 게다가 소련의 '지구 선회 궤도 비행'은 미국의 '탄도 비행(Trajectory flight)'보다 어려운 것이었다. 이리하여, 유인 우주 비행 경쟁에서도 소련의 승리로 끝났다.
1-3. 달 탐사도 소련이 먼저 시작했다.
미국은 인공위성 경쟁과 유인 우주 비행 경쟁에서 인류 최초 타이틀을 모두 소련에게 내주었다. 게다가 소련은 한발 앞서서 달의 과학적 탐사 활동을 시작했다.
소련은 1958년에 달 탐사선 '루나 1호(Luna 1)'를 보냈다. '루나 1호'는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했지만, 달에 착륙은 하지 못하고 달에 근접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해 '루나 2호(Luna 2)'가 '맑음의 바다(Mare Serenitatis)'에 명중시켰다. '맑음의 바다'란 달의 지형 이름으로, 달의 북위 25˚, 동경 15˚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게다가 1959년에는 '루나 3호(Luna 3)'가, 고도 7만 km에서 달 뒤쪽을 촬영하는 데 최초로 성공하였다.
1-4. 1960년대 안에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실현시키겠다고 선언하다.
한편 미국은 1961년에 '존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존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시점인 5월 25일에, 소련과의 경쟁에서 기사회생을 위한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1960년대에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프리덤 7호(Freedom 7)'의 유인 비행에서 3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야심찬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NASA의 예산은 1962년에 연간 12억 5700만 달러였던 것이, 1966년에는 국가 예산의 4.4%인 연간 59억 3300만 달러로 급증했다.

1-5. 제미니 계획(Project Gemini)
그리고 달 표면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된 '제미니 계획(Project Gemini)'에서는 최초의 '우주 유영(우주비행사가 위성선 또는 우주선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실현되었다. 제미니 우주선은 지름 3m의 2인승 우주선이었다. 하지만 미국 최초의 우주 유영은 1965년 6월 3일이었는데, 소련 최초의 우주 유영은 1965년 3월 18일이었다. 미국의 우주 개발은 여전히 소련에 한발 뒤진 상태였다.
제미니 계획에서는 우주 유영 외에도, 2개의 우주선 '랑데부(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만나는 일)'와 '도킹(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따위가 우주 공간에서 서로 결합함)' 테스트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달 유인 우주 비행을 위한 기술이 축적되었다. 그리고 1964년부터는 '레인저 시리즈(레인저 1호~9호)'에 의해 달 표면 사진도 촬영했다.
1-5. 서베이어 계획
한편 소련은 1966년에 '루나 9호(Luna 9)'를 달 표면에 연착륙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도 '서베이어 1호'로 달 연착륙에 성공하였다.
'서베이어 계획(Surveyor Program)'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달 탐사선 계획이다. 주 목적은 달표면 사진을 찍고 암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1호와 3호는 '폭풍의 대양'에, 5호는 '고요의 바다'에, 6호는 '중앙만'에, 7호는 '튀코 화구'에 연착륙하는데 성공하였다. 서베이어 탐사선으로 얻은 데이터는 그 후의 '아폴로 계획'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6. 아폴로 11호의 성공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선언한 기한이 임박한 1969년,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1969년 7월 16일에 발사된 '아폴로 11호(Apollo 11)'는 38만 km 떨어진 달에 접근해, 7월 20일에 착륙선 '이글 호(Eagle)'를 탄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 선장과 '에드윈 올드린(Edwin E. Aldrin)' 우주 비행사가 달 표면에 내려섰다. 이때 '닐 암스트롱'은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라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다. 두 사람은 약 21시간 반 동안 머무르며 2시간 31분 동안 선외 활동을 하였고, 그 모습은 전 세계에 텔레비전에 중계되었다.
한편, 소련은 아폴로 11호의 성공 직후, 유인 달 착륙은 무모하고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그리고 소련의 유인 달 표면 착륙 계획의 존재도 부정했다. 하지만 소련에서도 '1975년의 달 표면 착륙'을 목표로, 1964년부터 계획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공개되었다.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2. 컨스털레이션 계획
달에 인류를 보내는 데 성공한 미국은 이후, '무인 탐사선'에 의한 행성 탐사와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 개발, '우주 망원경(Space telescope)' 개발, 'ISS(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 등 더욱 실용적인 우주 개발에 집중했다. 그러다 2004년에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 1946~)' 대통령이 새로운 우주 개발의 지침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단 30년 가까이 NASA의 우주 개발을 지탱해 온 '우주 왕복선' 운용을 중단한다.
- 그리고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며, 새로운 달 행성 유인 탐사를 우주 개발의 첫 목표로 삼는다.
- 연방 의회의 승인을 얻은 NASA는 달 표면 기지 건설, 그리고 화성 유인 비행을 겨냥하는 새로운 유인 탐사 시스템의 개발을 개시한다.
이 프로젝트를 '컨스털레이션 계획(Project Constellation)'이라고 한다.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 달과 더 먼 우주로 인간을 수송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우주 왕복선'이 아닌,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한 원뿔형 '아폴로 우주선'이다. 대형 우주 왕복선과는 달리, 아폴로형 우주선은 안정성에서 뛰어나다. 또 아폴로 계획에서는 우주선을 쓰고 버렸지만,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10회 정도 재사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우주 왕복선'은 거대한 로켓추진체의 측면에 비행선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 이륙할 때 추진체에서 발포 단열재가 자주 떨어져 나오는 등 몇 가지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03년에 '컬럼비아호(NASA에서 만든 우주로 나간 최초의 우주 왕복선)'가 이륙할 때 문제의 발포제 조각이 기체의 날개와 충돌하여 '날개의 앞부분(검게 칠해진 부분)'을 덮고 있는 단열재가 떨어져 나갔다. 그 바람에 결국 대참사로 이어졌고, 이 사고로 NASA는 우주왕복선과 함께 7명의 우주인을 잃었다. 하지만 컨스털레이션 호는 승무원용 캡슐이 로켓추진체의 꼭대기에 얹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현될 염려가 없다.
'오리온'(Orion)'이라고 명명된 차세대 우주선은 '록히드사(Lockheed Corporation)'가 주요 설계를 담당하기로 했다. NASA의 각 연구 센터에서는 '존슨 우주 센터(Johnson Space Center)'의 '마크 가이어(Mark Geyer)' 박사를 중심으로 설계와 개발에 관한 실험이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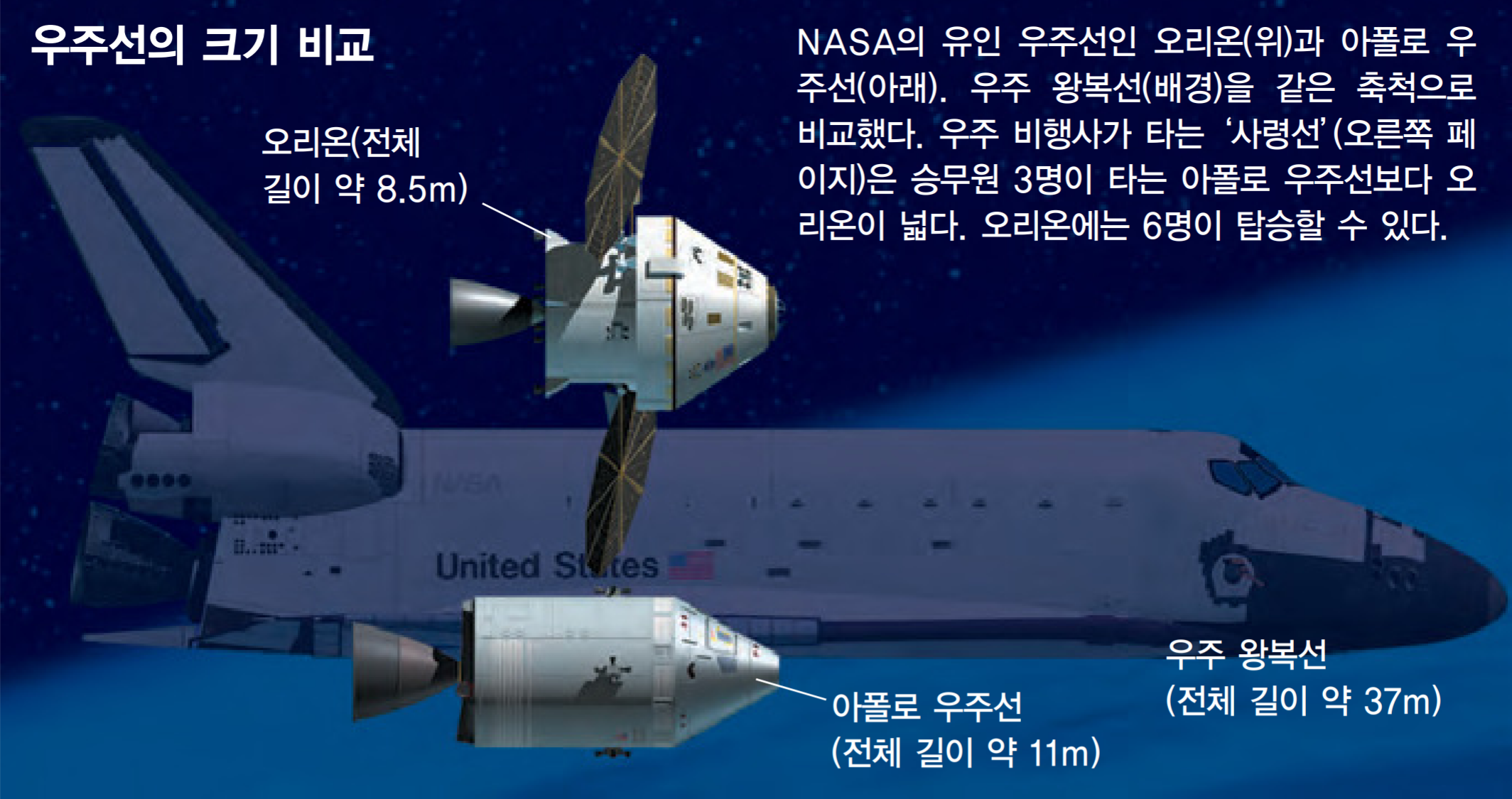
2-1. 무인 탐사 미션
NASA에서는 주요한 것만 해도 15건 이상의 무인 탐사 미션이 계획되어 있다. 2009년에는 '달 정찰 궤도선(LRO: Lunar Reconnaissance Orbiter)'를 발사했다. LRO는 'Reconnaissance(정찰)'이라는 이름 그대로, 달 표면에서 50km 높이로 선회하면서, 유인 탐사나 기지 건설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달 표면을 구석구석 조사한다. 탐재되어 있는 관측 기기의 절반을 물의 존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또 'LRO(Lunar Reconnaissance Orbiter)'를 발사하는 같은 로켓으로, 화구 내부의 물의 존재를 조사하는 'LCROSS(Lunar Crater Observation and Sensing Satellite)'라는 탐사선도 동시에 발사했다. LCROSS는 달의 남극 부근에서 조사를 맡았다.

2-2. '이사스(ESAS)'에서 '컨스털레이션 계획'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졌다.
2005년 4월에는 NASA의 11대 국장에 '마이클 그리핀(Michael Griffin)' 박사가 취임하였다.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추진하는 '마이클 그리핀' 국장은 같은 해 5월에 '컨스털레이션 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하는 연구회인 '이사스(ESAS: Exploration Systems Architecture Study)'를 발족시켰다. ESAS는 컨스털레이션 계획의 구체적인 방침을 정했다. 현재 NASA는 본부에 있는 탐사 시스템국을 중심으로 ESAS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우주 센터에는 '컨스털레이션 계획'의 집행부가 설치되었다.
2-3. 인간과 화물은 서로 다른 로켓으로 발사하기로 했다.
'우주 왕복선'은 우주 비행사와 화물을 한꺼번에 운반하는 대형 유인 우주선이었다. 하지만, ESAS에서 상세히 검토한 결과,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우주비행사가 타는 '오리온(Orion)'과, 장래 달에 착륙할 때의 착륙선 같은 화물을 별도의 로켓에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간과 경량의 화물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은 '아레스 Ⅰ(Ares Ⅰ)', 더 무게가 나가는 화물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은 '아레스 V(Ares V)'이다. '아레스 Ⅰ'은 약 25t, '아레스 V'는 약 144t의 무게를 지구 선회 궤도에 발사시킬 수 있다. '아레스 V(Ares V)'는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된 '새턴 V(Satrun V)' 로켓의 1.2배 중량을 발사할 수 있다.
로켓을 백지 상태에서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은, 비용과 안정성 면에서 낭비와 위험 부담의 요소가 크다. 그래서 NASA에서는 '우주 왕복선'이나 '아폴로 계획'에서 쓰인 새턴 로켓 등 이미 확립된 기술을 살리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2-4. 화물과 우주선을 궤도상에서 도킹시킨다
'아레스 Ⅰ(Ares Ⅰ)' 로켓과 '아레스 V(Ares V)' 로켓에 의해, 지구를 선회하는 '지구 선회 저궤도'에 각각 발사된다. 궤도상에서 오리온과 화물이 합체된 후, 달 등의 목적지로 향한다. 달 표면에 인류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아폴로 계획'에서는 '유인 우주선'과 '달 착륙선'을 하나의 대형 로켓으로 한 번에 발사했다. 그러면,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왜 지구 궤도상에서 합체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첫 번째 이유는 '로켓 개발 비용의 문제' 때문이다.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기지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달 표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필요한 화물을 일시에 발사하기 위해서는 새턴 로켓을 훨씬 웃도는 대형 로켓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 비용이 막대해져서 예산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다.
- 두 번째 이유는 '미션의 다양성' 때문이다.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달이나 화성뿐만 아니라 'ISS(국제 우주 정거장)'도 목적지 중 하나이다. 화성으로 가가려면, 큰 중량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로켓이 필요하다. 하지만 ISS로 가는 비행에는 대형 로켓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의 로켓으로는 다양한 미션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NASA에서는 발사 무게가 다른 두 종류의 로켓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아레스 Ⅰ(Ares Ⅰ)'만 발사한다. 그리고 달이나 화성 미션에는 양쪽 로켓을 모두 발사하고, 궤도상에서 합체시킨 후 달이나 화성으로 간다.

2-5. 달 유인 탐사 계획
'컨스털레이션 계획'의 최초 미션은 인류를 다시 달 표면에 내리게 하는 일이다. 인류의 마지막 달 착륙은 아폴로 계획에서의 1972년이다. 그 후 인류는 2021년 현재까지도 한 번도 달 표면에 내린 적이 없다. 다시 달 표면에 인간을 보내는 것은 NASA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달에 가는 최초 미션에서는, 아폴로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달 표면에서 짧은 기간 머물다가 돌아온다.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어떻게 달로 가는지 살펴보고, '아폴로 계획'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자.
- 발사: 우선 '아레스 V(Ares V)'로 'EDS(Earth Departure Stage)'와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 그다음에 '아레스Ⅰ(AresⅠ)'로 우주 비행사가 탄 오리온을 발사한다. 달에 머무는 7일간의 미션에서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오리온에 탄다. 아폴로 계획에서는 '새턴 V'로켓으로 '우주선'과 '달 착륙선'을 한꺼번에 발사했다.
- 지구 선회 궤도상에서 랑데부하기: 우선 '달 착륙선'을 부착한 'EDS(Earth Departure Stage)'가 지구 선회 저궤도상에서 '랑데부(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만나는 일)'하여 합체한다.
- 달로 향하는 비행: 그리고 합체 후, EDS의 엔진으로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는 속도까지 가속하여 달로 향한다. 달로 가는 궤도에 들어선 다음 EDS는 버려진다.
- 달 선회 궤도로 진입하기: 달 착륙선의 엔진을 써서 달 선회 궤도로 진입한다. 아폴로 계획에서는 적도 부근 상공의 선회 궤도만을 이용했지만,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선훼 궤도의 변경이 가능해, 달의 어느 지점에도 착륙할 수 있다.
- 달 표면에 착륙하기: 달 착륙선은 오리온에서 분리되어, 엔진을 사용하면서 달 표면에 연착륙한다.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4명 전원이 달 표면에 착륙한다. 달 표면에서 활동하는 동안, 오리온은 자동으로 선회 궤도를 돌고 있다. '아폴로 계획'에서는 3명의 우주 비행사 중 2명이 달 표면에 내리고, 1명은 선회 궤도상의 우주선에 남았다.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체류 기간도 4일이 늘어나, 7일로 계획되었다.
- 달 선회 궤도상에서 랑데부하기: '달 착륙선'은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내려주고, 다시 모선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우주선이다. 달 표면에서의 미션이 끝나면, 우주 비행사는 '달 착륙선' 상부에 있는 '상승 모듈'로 선회 궤도에 되돌아간다. 달의 선회 궤도에서 '오리온'과 '달 착륙선'은 랑데부 합체하고, 우주 비행사는 오리온에 옮겨 탄다. 그 후 '상승 모듈'은 분리되어 버려진다.
- 지구로 귀환하기: 오리온의 엔진을 써서 달 선회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향한다. 지구까지는 적어도 3.5일이 걸린다.
- 지구 도착: 지구에 접근하면 오리온의 엔진이 있는 서비스 모듈이 분리되어 버려진다. 남은 원뿔형 사령선은 대기권에 돌입한 후, 낙하선을 써서 육지에 착륙한다. 이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에어백이 사용된다.
- 오리온 회수하기: 육지에 착륙한 오리온은 회수되어 다음 미션에 다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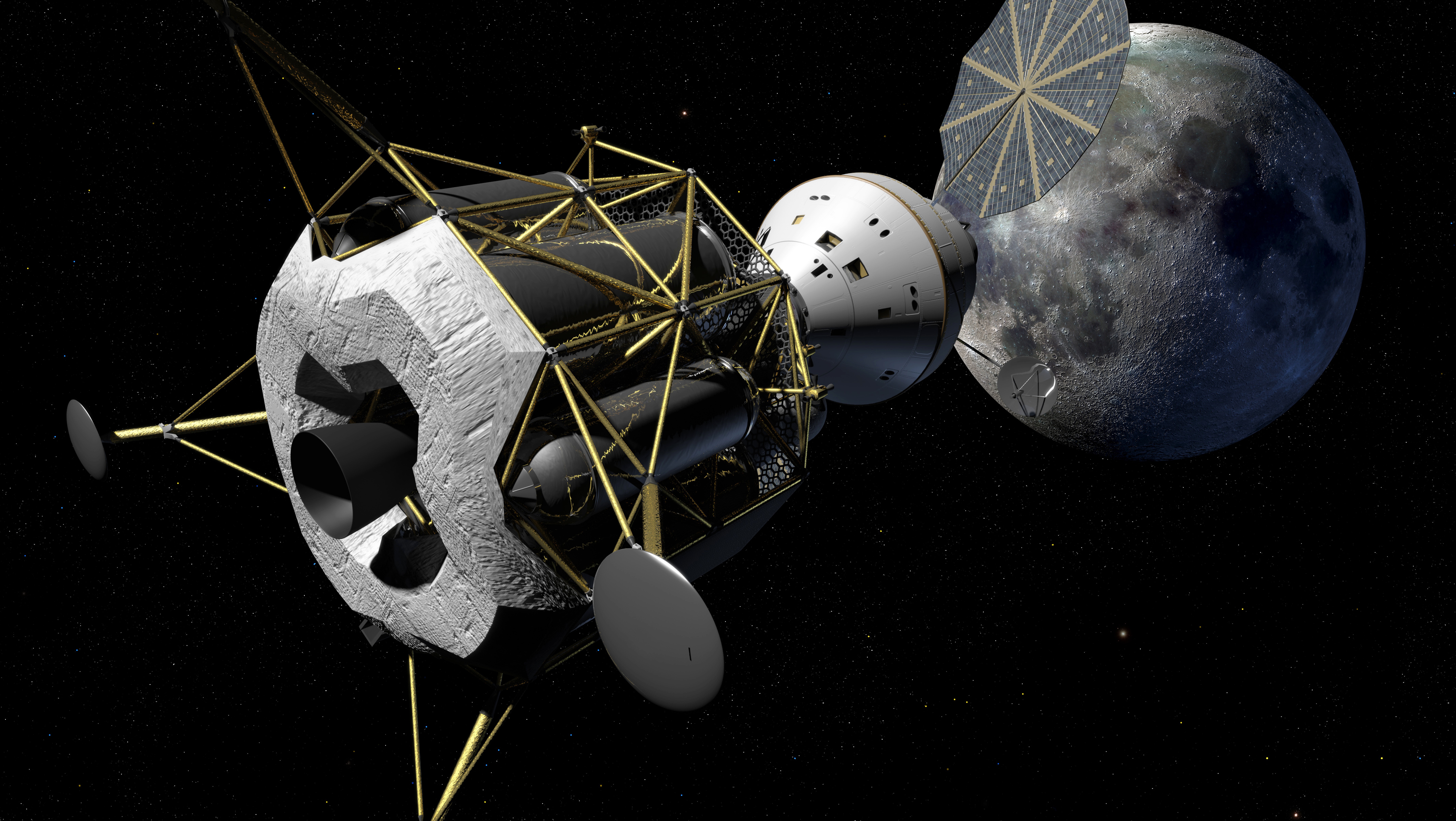
2-6. 달 착륙선 '알테어'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 사용되는 신형 달 착륙선의 이름은 '알테어(Altair)'이다. '알테어'의 기본 구조는 '아폴로 계획'의 착륙선과 마찬가지로, 하부의 '강하 모듈'과 상부의 '상승 모듈'로 나눌 수 있다. '상승 모듈'은 우주 비행사가 체류하는 거주 공간이 되고, 달 표면에서 달의 선회 궤도까지 우주 비행사를 수송하는 우주선 역할도 한다. 4명의 우주 비행사가 1주일 동안 달 표면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알테어'는 아폴로 계획의 착륙선보다 크게 만들 예정이다. 또 아폴로 계획과는 달리 화물만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화물만 실을 경우 14t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다.
아폴로 계획에서 실시한 6회의 착륙은 모두 달의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 범위에 한정되어 있었다. 더 고위도 지점에 착륙하려면, 선회 궤도를 변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컨스털레이션 계획에서는 충분한 연료를 실을 수 있어, '알테어'는 달의 어느 지점에나 착륙할 수 있다. 그 결과, 달의 모든 지역에서 유인 탐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달 표면 기지를 건설한 후보지도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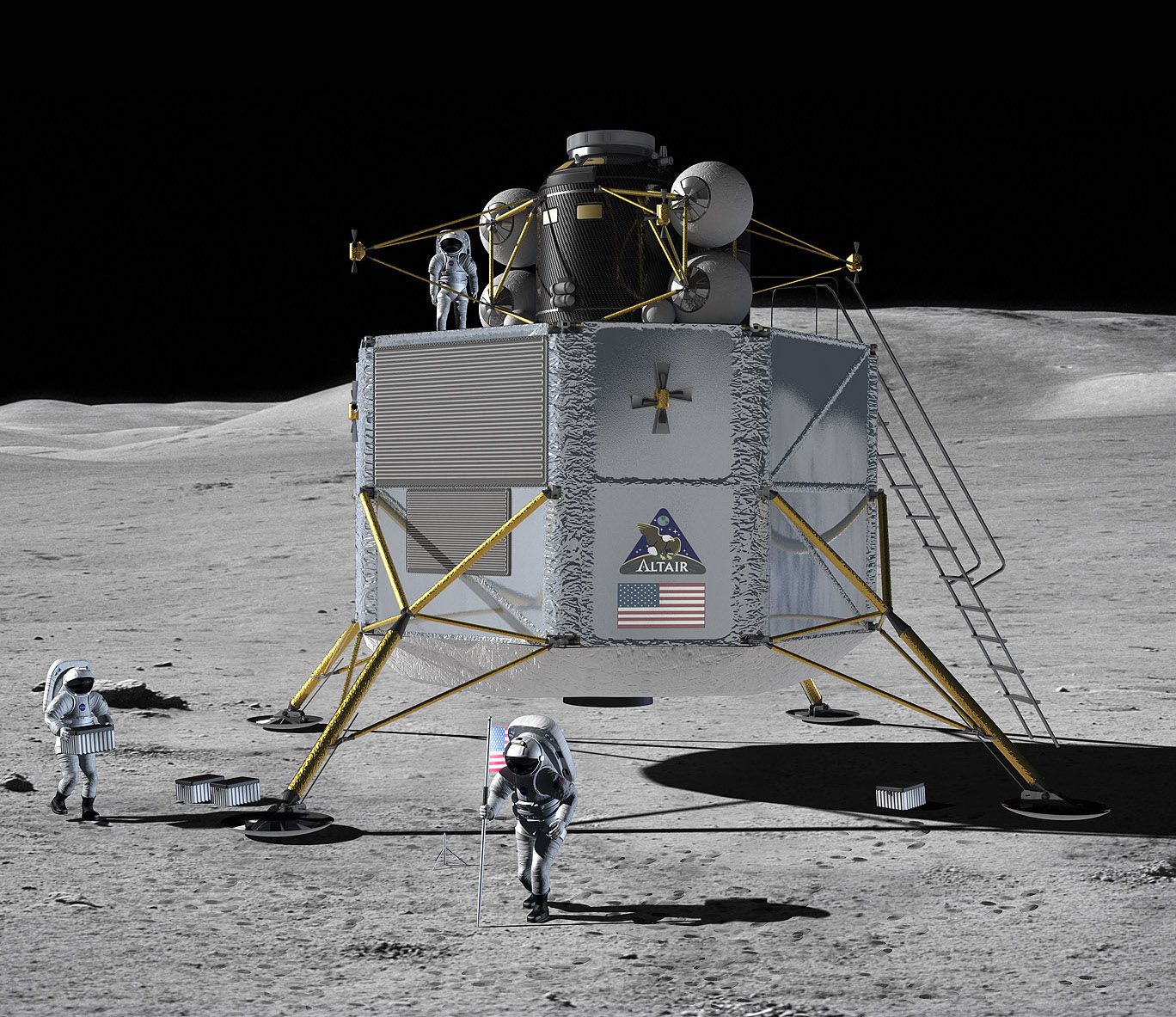
2-7. 달에 기지 건설하기
2-7-1. 지하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
달 표면에 상륙을 성공시킨 다음에는, NASA는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고, 우주 비행사를 장기 체류시킬 예정이다. 달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운석'이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온 바위들이 달 표면에 수시로 떨어지고 있다. 달의 표면을 보면 알겠지만, 달에는 크고 작은 분화구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들 중에는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것도 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한번 생긴 분화구는 반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모든 운석이 크기에 상관없이 시속 64000km로 떨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알갱이라고 해도 이런 속도로 떨어지는 물체는 우주복을 관통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달에서 우주복의 손상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큰 운석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운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달에 '지하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과거의 달은 화산활동이 활발했으므로, 내부 깊숙이 연결되는 용암동굴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2009년에 달에서 대형건물만 한 용암동굴을 발견했는데, 이 정도면 지하기지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 '우주선(Cosmic ray)'과 '홍염(Red flame)', '미세운석(Micrometeorite)' 등을 막는 수단으로 천연 동굴을 이용한다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2-7-2. 영구 일조 지대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태양빛이 닿는 지표는 쉽게 고온이 되지만, 그늘에서는 열이 우주 공간으로 달아나기도 쉬우므로 쉽게 저온이 된다. 그 결과, 극 지역 이외에서는 낮에 평균 100℃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150℃까지도 내려간다. 하지만 달의 극 지역에는 태양빛이 닿는 곳의 온도가 -40℃~60℃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 달의 극지역에서는 태양이 낮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거의 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극에는 태양빛이 없어지지 않는 '영구 일조 지대'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태양 전지판 등으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상시 발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NASA에서는 남극을 기지 건설을 위한 최유력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다.
2-8. 달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2-8-1. 현지에서의 자원 이용
NASA에서는 달 표면 기지에서의 장기 체류를, 장래의 화성 유인 비행에 활용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달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운반해가는 자원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자원도 이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을 '현지에서의 자원 이용 (ISRU: In-Situ Resource Utilization)'이라고 한다. ISRU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존슨 우주 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한다.
극 부근에 있는 화구의 바닥에는 태양빛이 1년 내내 비치지 않는 '영구 그림자'라고 불리는 극한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영구 그림자'는 북극보다 남극에 많다. 영구 그림자의 바닥에는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만약 이곳에 얼음이 존재한다면, 과거에 충돌한 혜성에 포함된 얼음이 흩날린 것일 것이다. 물이 있다면 생활용수나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기 분해하여 산소와 수소도 얻을 수 있다.
달 표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용해 연료가 되는 '메탄(CH4)'을 합성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또 방사선 문제도 극복해야 하며, 저온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NASA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대처법이나 달 표면 기지의 규모, 체류 인원 수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2-8-2. 레골리스(Regolith)
달 표면에는 모래 형태의 '레골리스(Regolith)'라는 달 표면의 돌가루 모양의 물질이 있다. 레골리스'는 수십 μm로 아주 작다. 이것이 기기에 들어가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이 흡입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또 레골리스에는 산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온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산소를 꺼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안되고 있다. 또 레골리스를 파내거나 운반하는 기계의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레골리스를 고온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태양 집광경'의 연구 등도 이루어진다. 아래의 화학식은 레골리스에서 산소를 꺼내는 방법의 한 예이다. 먼저 산소가 있을 때, 레골리스를 고온 상태로 함으로써 환원(Reduction)'시켜 물을 얻는다. 그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다.
- 레골리스(FeTiO3) + H2 → Fe + TiO2 + H2O
- H2O → H2 + O2
3. 오바마 정부가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취소시켰다.
3-1. 유인 우주선 사업은 '민간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8년에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불경기가 닥치면서 우주사업 투자가 위축되는 바람에 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09년에 '오거스틴 위원회(Augustine Commission, NASA의 계획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Barack Obama, 1961~)'은 내용을 받아들여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취소시켰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 제공을 약속하며, 소형 유인 우주선 개발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당장 로켓이 없으면 NASA는 우주에 사람을 보낼 때, 러시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업용 우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 우주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또 달 탐사가 종착지였던 '컨스털레이션 계획' 대신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을 새로 발표했다.이러한 흐름 뒤에는 '유인 우주선'처럼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불분명한 산업을 민간으로 넘기고, 원거리 탐사 등 최신 기술 개발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놓여 있다. 실제 미연방정부 예산 대비 NASA의 예산 비중은 1966년에 4.41%에서 2020년에 0.48%로 급감하였다. 예산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 정부의 우주 개발 산업에 대한 철학은 '국가 역량을 집약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능한 성취를 달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 공백으로 남겨진 유인 우주선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 X(Space X)'나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블루 오리진(Blue Origin)'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었다.

3-2. '오리온'은 재사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폐기하면서 새로운 옵션을 제시했다. 우주인을 달에 데려다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리온(Orion)' 모듈을 국제우주정거장의 비상탈출용 캡슐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므로, 그동안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